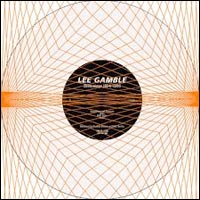 "nowhen hooks" / "tvash kwawar" (from [dutch tvashar plums]) |
10
LEE GAMBLE Diversions 1994-1996 / Dutch Tvashar Plumes (pan) |
일렉트로닉 음악을 찾아 듣는 이유가 단지 가슴을 뛰게 하는 비트와 몸을 들썩이게 하는 그루브 때문이라면 지금 소개할 일렉트로닉 앨범 패키지는 그냥 건너뛰어도 좋을 아이템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폴 밴 다잌(Paul Van Dyk)이나 데이빗 궤타(David Guetta), 덥스텝... 물론 다 흥겹고 좋은 전자 음악임은 맞지만, 이와는 반대로 전통 악기에 의한 고전적 작곡법을 파괴하고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자 음악의 실험적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존중하는 미덕을 음악 애호가라면 더불어 갖춰야 할 것이다('지루하다'는 단세포적 코멘트만 하지 말고... 응?). 우리가 일렉트로닉 음악의 탄생 이념과 배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오직 흥겨움 유발용 EDM 혹은 댄스/테크노 장르로 한정해서 바라본다면 이는 곧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인과관계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전자악기를 예술 창작의 도구로써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려했던 부소니(바흐의 편곡으로 유명한 작곡가), 전축을 거꾸로 돌린 듯한 음악을 고안했던 에드가르 바레즈, 올리비에 메시앙의 [튀랑갈릴라 교향곡 (1948): 전자악기 Ondes Martenot를 최초로 성공적으로 도입한 작품. 한국이 낳은 진정한 천재 정명훈의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 버젼이 역대 최고 명반)], 그리고 이어지는 피에르 쉐퍼 등 테잎 음악에 이르기까지 전자음악/전자악기는 '새로운 시도'를 창작의 기본 아젠다로 간주하는 20세기 순수예술의 카테고리에서 언제나 중요 창작 매개체로써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소개할 잉글랜드 버밍엄 출신의 익스페리멘탈/일렉트로닉 뮤지션 리 갬블(Lee Gamble)은 음악 그 자체보다 일렉트로닉 음악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실험성'이라는 방법론적 관점(순수예술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미학적 관점)에서 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발표된 두 장의 걸작 추상표현주의 전자음악 작품 [Diversions 1994-1996]와 [Dutch Tvashar Plumes]을 통해 90년대 말 폭발적인 상승곡선을 그리며 급유행을 타다 급속하게 사려져갔던 '드럼앤베이스'라는 댄스성향의 장르를 실험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렉트로닉 뮤직 프로덕션의 새로운 창작 양식을 탄생시키고자 한다. 철 지나 폐기처분되기 직전의 구식 음원 더미 쯤으로 전락한 드럼앤베이스. 요즘 중고 CD 가게 일렉 코너에 가보면 왕년 일렉 매니어들의 심금을 울렸던 골디, 로니 사이즈, LTJ 부켐의 드럼앤베이스 더블 시디들이 떨이로 판매되는 모습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Diversions 1994-1996]은 왕년 정글 DJ였던 리 갬블 자신이 소시절 녹음해 놓았던 드럼앤베이스 카세트 믹스테잎들을 먼지더미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어 카세트 테잎 안에 담긴 음원들을 철저하게 해체시켜 재편집한 추상적 아날로그 사운드 소품들의 모음집이다. 몽환적인 효과 연출에 그만이었던 드럼비트, 신쓰음, 베이스 등의 리버브 음향을 몇 프레임만 추출해 길게 늘어뜨린 다음 테잎의 먼지 소음과 믹스시켜 색다른 질감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한다던가, 혹은 트랜스 음악의 추임새로도 즐겨 쓰이곤 하는 얍삽한 신쓰 리프나 디바 보이스들을 분절 -> 추출 -> 이완 -> 루핑의 가공 과정에 의해 BURIAL이나 ANDY STOTT 못지 않은 다크 사운드스케잎을 연출하는 등의 실험적 어프로치들은 요즘 대세인 대니얼 로파틴 류의 사운드 리바이벌리즘과 비교해봐도 그 파격적/독창적 면모가 가히 두드러진다. 마치 히치콕 영화 '사이코' 를 슬로모션으로 이완시켜 '찰나의 미학'을 새롭게 서술하고자 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현대미술가 더글라스 고든(Douglas Gordon)의 비디오 아트웍 '24시간 사이코 (1993)'와 일맥상통하는 방법론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견지하며 그 파편들을 아트웍으로 재구성할 때 얻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고자 하는 리 갬블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어프로치는 이어지는 두번째 소품집 [Dutch Tvashar Plumes]의 창작 필로소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일반적 일렉트로닉 매니어들의 취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건지 [Dutch Tvashar Plumes]에는 몰대중성으로 빛나는(?) [Diversions]에 비해 댄스형 일렉트로닉 특유의 규칙적인 비트루핑이 그나마 자주 등장해준다. 따라서 서두에서 묘사했던 '일렉트로닉의 고정관념' 때문에 [Diversions]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일단 [Dutch Tvashar Plumes]를 워밍업용으로써 먼저 들어보라고 권하고자 한다.
 "five seconds" |
9
TWIN SHADOW Confess (4ad) |
인디에서 주류로의 이동에 의한 혜택이 아니라면 베드룸(bedroom)에서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름칠이 반드시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는 없다. 머릿 속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베드룸 4트랙보다 스튜디오 사운드시스템에서 더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앞서 언급했던 WILD NOTHING의 [Nocturne]처럼 로파이/베드룸에서 묻혔던 자신의 개성을 스튜디오에서 당당히 표현하고 싶어하는 건 어찌보면 뮤지션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욕심일 것이다. 도미니카 공화국 태생(하지만 현재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 중)의 DIY 뮤지션 조지 루이스 주니어(George Lewis Jr.)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데뷔앨범 [Forget (2010)]을 통해 베드룸 로파이와 원맨밴드의 진수를 제대로 피력했던 그는 전통의 톱클래스 인디 레이블 4AD와 계약을 맺고 침실에서 나와 정식 스튜디오에서 서퍼모어 앨범을 제작하는 모험을 감행한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 그는 모든 사운드가 밝고 깔끔해진 [Confess] 안에서 프린스, 데이빗 간(David Gahan; DEPECHE MODE) 등 80년대 레트로/뉴웨이브 아이콘들의 허세근성을 캐릭터화하여 자신감 넘치는 나르시시즘 카리스마로써 자기 입맛대로 빈티지 팝 사운드를 떡주무르듯 요리, 로파이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끼를 비로소 대폭발시켜낸 것이다. DEPECHE MODE("You Call Me On"), THE CURE("The One"), THE POLICE("Run My Heart"), PRINCE("Patient"), AR KANE("Mirror in the Dark")같은 고급 사운드부터 조지 마이클("The One"), MILLI VANILLI("Beg for the Night") 같은 유치찬란 사운드까지 아우르는 그의 빈티지 퍼레이드는,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 미리 구상된 속도감, 파워, 리듬을 시종일관 유지하며 인디 음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원맨 스튜디오 앨범을 완성시킨다. 루이스 주니어 단독의 힘으로 모든 인스트루멘테이션(instrumentation)이 처리된 [Confess]의 연주 소스는 아주 단촐하다. 기타, 베이스, 드럼머쉰, 그리고 양념비율로 약간 첨가된 신씨사이저가 전부. 하지만 극도로 간결하게 구사되지만 억양이나 삘 면에서 능글맞을 정도로 확신에 차 있는 배킹 연주 리프들은 전문 세션맨들의 배킹 연주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원숙하게, 거침없이, 속도감 넘치게 매 트랙을 장식한다. 어떤 악기 배킹이 어떤 부분에서 엑센트가 주어져야 하는지 혹은 불필요한지를 원맨밴드 리더로서 그만큼 자기가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원맨 사운드가 연출될 수 있었던 것. 특히 그의 손에 의해 100% 연주된 기타/베이스와 드럼머쉰 간의 콤비네이션은 가공할만한데, 가장 단순한 형태의 리듬패턴이지만 록과 훵크(funk)의 중간 형태의 억양으로 적시적소에 윽박질러대는 드럼머쉰의 킥+스네어 파워 비트에 맞춰 베이스("Beg for the Night")와 기타("Five Seconds")를 울러매고 그루브감 넘치게 연주하며 능글맞은 보컬 삘을 작렬시키는 그의 모습에서 베테랑 아레나 로커의 애티튜드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속도감과 비트 파워/그루브만으로 TWIN SHADOW의 디테일한 면모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일. 다양한 코드웍에서부터 아르페지오("Run My Heart"), 그리고 [Purple Rain] 시절 프린스 스타일의 솔로플레이("Patient")까지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루이스 주니어의 기타 실력은 가히 정상급 수준이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절제된 기타리프를 매 순간 유지한다!) 신쓰/베이스/기타/드럼비트가 아기자기한 레이어링과 시퀀싱에 의해 깔끔하게 구사되는 면모에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원숙미와 센스까지 더불어 엿볼 수 있다. 소시절 R&B와 프린스, 보이즈투멘, 바비브라운의 팬이었다가 어느 순간 DEAD KENNEDYS, BUZZCOCKS 등의 펑크록 매니어로 바뀌었다는데, 그 드라마틱한 음악 취향 변화 덕분일까. [Confess]는 프린스나 훵크의 흑인음악적 리듬/비트 감각과 디페쉬모드의 폭발적인 록 감수성이 루이스 주니어의 탁월한 끼에 의해 황금비율로 혼합된, 가장 파워풀하면서도 리드미컬한 80년대 퓨전 사운드가 담긴 작년 최고급 원맨 밴드 명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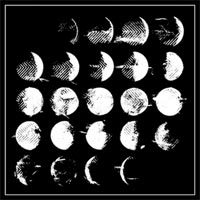 "trespasses" |
8
CONVERGE All We Love We Leave Behind (epitaph) |
미국 메사추세츠주 출신의 하드코어 펑크/메틀 밴드 CONVERGE의 네번째 스튜디오 앨범 [Jane Doe (2001)]는 2001년 한해 뿐만 아니라 2000년대를 통들어 가장 의미심장했던 뉴메틀(nu metal)/하드코어 앨범들 중 한장이었다. 스피드와 파워는 차치하고서라도 필인파트부터 피날레에 이르기까지 매 트랙마다 신속하고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고급 구성력은 뻔한 패턴 안에서 단순무식하게 돌아가는 꼴통음악 이미지가 강했던 하드코어음악의 보편적 핸디캡을 한방에 깨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는 마치 박력넘치는 펑크 에너지 속에 복잡한 전개방식과 어프로치를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던 FUGAZI [Red Medicine (1995)]의 스피드/파워 업그레이드 버젼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Jane Doe] 이후 거의 3년 간격으로 세 장의 A급 정규앨범을 꾸준히 내놓았던 CONVERGE가 [Axe to Fall (2009)] 이후 3년만에 어김없이 선보인 여덟번째 정규 앨범 [All We Love We Leave Behind]는 기타리스트 커트 볼루(Kurt Ballou)의 완벽한 프로듀싱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부터 이들이 시도해온 스피드/쓰래쉬 메틀과 하드코어 펑크 스피드/리듬 간의 잡종교배 작품들 중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앵거스 영(AC/DC)풍 고급 태핑 기타 테크닉과 데이빗 롬바르도(SLAYER)풍 초절기교 투베이스 드러밍이 맛배기로 가미된 트랙 "Sadness Comes Home"에서 보듯 이 네 명의 멤버 개개인이 구사해내는 연주 테크닉들은 현존하는 뉴/익스트림 메틀 밴드들, 그리고 더 나아가 '테크닉으로 시작해서 테크닉으로 끝나던' 구석기 시대 헤드뱅잉 메틀 밴드들과 비교해볼 때 전혀 뒤지지 않은 수준의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하드코어 신명내기를 위한 추임새 차원에서 이러한 엘리트적 테크닉을 간간이 이용할 뿐 무의미한 솔로 연주 등 헤어메틀류 멋부리기의 구태에는 절대 얽매이지 않는다. [All We Love We Leave Behind]가 펑크 레이블 에피탚(Epitaph) 발매 앨범이라는 점에서도 보듯, 이들의 음악적 뿌리는 모터헤드나 블랙 사바스 같은 자기과시적 암흑/악마 메틀의 반대급부로서 태어났던 하드코어 펑크 장르의 '단순함에 입각한 파워 그루브 구현'에 근본적으로 천착해 있는 것. 앞서 언급했듯이, 기라성같은 메틀 밴드들에 필적할만한 고난도 기교를 구사할 수 있음에도 CONVERGE는 이전 앨범들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자주 부렸던 솔로플레이들을 [All We Love We Leave Behind]에서 극도로 절제하고 대신 슬럿쥐(sludge)와 하드코어의 변종 파워 기타코드웍, 펑크(punk) 정신 투철한 스네어 난타 위주의 드러밍 등 단순한 형태의 악기 어프로치를 메인으로 내세워 세상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스피디한 형태의 하드코어 음악을 구사하는 데 성공한다. 메틀의 폭발적 파워/스피드와 하드코어의 그루브가 타이트하게 동시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뭐니뭐니해도 프로듀서이자 팀의 기타리스트인 커트 볼루의 탁월한 프로듀싱 감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Honorary Mentions'에서 볼루의 프로듀싱 작품인 BLACK BREATH의 [Sentenced to Life]를 소개할 때 잠시 언급했듯이 뉴/익스트림 메틀 프로듀서로서 메틀의 장점과 하드코어의 장점을 트렌디하게 교배시키는 그의 능력은 가히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구시대 메틀의 전유물인 쓸데없는 악기 연주 레이어와 솔로파트들을 최소화하고 파워, 스피드, 그루브를 스무쓰하게 업그레이드 시켜낸 볼루의 프로듀싱은 최고의 연주력을 자랑하는 밴드 사운드와 만나 역대 최고의 하드코어 메틀 앨범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10" |
7
DEAN BLUNT & INGA COPELAND Black Is Beautiful (hyperdub) |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혼성 듀오 딘 블런트(Dean Blunt)와 잉가 코플랜드(Inga Copeland)의 정규 앨범 [Black Is Beautiful]은 2012년 물밀듯이 터져나온 사운드 콜라쥬/리바이벌리즘 음악 중 군계일학의 캐릭터를 지닌 앨범이다. 아시는 분은 벌써 아시고도 남았겠지만, 이들은 이미 'Hype Williams' 라는 이름으로 그룹활동을 해왔던 중고신인 그룹이다. 뮤직비디오, 영화 등 주옥같은 흑횽들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하잎 윌리엄스(Hype Williams)횽과 같은 이름을 의도적으로 걸고 활동하는 대범함으로 인디음악팬들에게 범상치 않은 전조를 일찌감치 보여줬던 이들은 이번 앨범이 'Dean Blunt & Inga Copeland' 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첫 정규음반인 셈이다. 사실 괴상한 이들의 역사적 배경보다 팬들에게 더 범상치 않게 다가오는 것은 역시 앨범에 담긴 '음악'이다. 일렉트로닉, 포스트베이스(post-bass), 레프트필드 뮤직(left-field music), 덥(dub) 등으로 어지럽게 분류된 앨범 장르만 봐도 뭔가 괴짜스멜이 확 오는데, 그들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예술적인 더티 질감, 테잎사운드같은 아날로그 느낌, 불규칙하게 변형된 샘플/룹(loop) 등에서 이를 재차 확인시켜준다.계속 멍때리면서 듣게 만드는 묘한 이들만의 음악, 과연 어떤지 앨범 안으로 들어가 주요 트랙들을 한번 훑어 보자. "(Venice Dreamway)"라는 제목이 유일하게 달린 1번트랙에서는 시작부터 범상치 않게 원조 헤비메틀 밴드 Black Sabbath의 "Sweet Leaf"라는 곡에서 추출된 기침소리 샘플이 등장하며(비스티 보이스 등 다른 장르 음악들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샘플이다) 이후 재즈드럼 솔로 같은 '더 이상 내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화려한 드럼플레이가 뜬금없이 선보여진다. 2번트랙은 덥사운드를 살짝 연상시키는 노골적 에코와 킥드럼이 꿈꾸는 듯한 잉가의 보컬 목소리와 슬로템포에서 만나 리스너에게 몽롱한 최면을 거는데, 전반적으로 꿈나라와 영적 혹은 미지의 세계로 이빠이 떠나는 부조리 스타일이 완전 압권이다. 뒤에서 계속 속삭이면서 뭔가 주문을 거는 듯한 앱스트랙트(abstract) 보이스 샘플이 인상적인 4번트랙 역시 신쓰와 피아노 배경음을 파격적으로 집어넣어 몽롱한 분위기를 괴상하게 이끌어간다. 7번트랙은 마치 DAM FUNK, COM TRUISE 등의 음악에서 느꼈던 변칙 슬로모션 쥐펑크(G-funk)의 베이스사운드가 딘 & 잉가 스타일로 응용되어 짧지만 의미심장하게 앨범 중앙부를 인상지우며, 8번트랙에서는 몽롱함, 차분함, 섬뜩함을 동시에 갖춘 희안한 분위기의 신쓰 사운드를 선보인다. 9번트랙은 제임스 블레이크(James Blake)만큼이나 목소리 음악의 정점을 의미심장하게 찍는 곡이다. 한편의 엽기 비디오아트를 축약해놓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낮게 피치다운(pitch down)된 듯한 목소리가 일단 먼저 등장하여 마약중독자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지껄이다 "never look back" 즉, '뒤를 돌아보지 마라'고 섬뜩하게 반복해서 얘기하니, 진짜 지대로 앞만 보고 가야될 거 같은 생각을 심어준다. 달콤하게 젖어드는 잉가의 보컬로 잘 나가다 뜬금없이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삽입된 남자의 코멘트. "백횽들이 '섹스를 잘 못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영판 십대반항아야!". 아주 심오한 곡이다. 11번트랙은 디스코펑크(disco funk)풍 아날로그 비트에 제임스 페라로(James Ferraro)를 연상시키는 유치찬란 카시오 신쓰 리프,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내지는 에리카 바두(Erikah Badu)와 같은 느낌으로 노래하는 잉가의 보컬이 합쳐져서 묘한 사운드를 자아낸다. 12번트랙은, 마치 정글/드럼앤베이스 비트처럼 미친 듯이 쪼개는 드럼과 멜로함에 취한 듯한 잉가의 디바스런 보컬, 그리고 패드사운드 등이 꿈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나름 '제대로된' 일렉트로닉 트랙이다. 그리고 마치 자다깼는데 어느덧 버스 종착역인 듯한 느낌의 비장한 곡으로 앨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15번) 트랙까지, 첫곡 빼고 트랙 제목조차 없는 그야말로 리스너 맘대로 알아서 상상의 세계로 정처없이 흘러들어가게끔 리드하는 앨범이 바로 [Black Is Beautiful]인 것이다. "딘 블런트 & 잉가 코플랜드는 이 시대 최고의 포스트모더니즘 퍼포먼스 아트 그룹"이라는 BKC횽의 말씀대로, 특정한 장르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대뇌 안에서 흔히 그리곤 하는 대중 음악의 모든 도식들을 철저하게 난자하고 해체하는 행위들을 거쳐 흘러나온 모든 소리들을 레코드에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 바로 [Black Is Beautiful]이 아닐까. 기존의 뻔한 음악들에 다소 힘겨워하실 여러분들도 이 앨범을 들으면서 추상적/몽환적인 드림웨이(dreamway)로 흘러가 근사한 악몽을 한번 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poetic justice" |
6
KENDRICK LAMAR good kid, m.A.A.d city (interscope / aftermath / top dawg) |
'LIS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The Top Albums of 2013: Honorable Mentions (part 1) (3) | 2014.01.30 |
|---|---|
| The Top 30 Albums of 2012: #5 - #1 (10) | 2013.03.01 |
| The Top 30 Albums of 2012: #15 - #11 (11) | 2013.02.01 |
| The Top 30 Albums of 2012: #20 - #16 (5) | 2013.01.28 |
| The Top 30 Albums of 2012: #25 - #21 (6) | 2013.01.23 |